- [ 2024-11-20 ] 한국의료윤리학회 - 추계합동학술대회 개최 안내(11/23(토))
- [ 2024-11-18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 [ 2024-11-1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 채널의 '생명윤리법 제정 00주...
- [ 2024-11-12 ] 2024년 하반기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 2024-10-30 ]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시 구제 방법 안내
| 발행년 : | 200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기독교윤리 (박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480997 |
생명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Life Cloning and Christian Ethics : Human Cloning Restrictions : Bioethical and Legal Issues
- 저자 : 구홍일
- 형태사항 : 296 p. ; 26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강응섭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기독교윤리 2007. 8
- KDC : 230
- DDC : 230
- 발행국 : 경기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7
- 주제어 : 생명복제, 기독교 윤리적 성찰, 인간복제, 체세포조작, 무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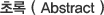
1996년 7월 5일(1997. 2. 24 발표), 스코틀랜드 로슬린(Roslin) 연구소의
윌머트(Ian Wilmut) 박사 팀에 의해 사상 최초로 암양끼리의 ‘체세포핵치환’(體細胞核置換)의 방법에 의해 복제양 돌리(Dolly)가
태어났고, 이 복제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인간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중세 암흑기이래 오랫동안 휴전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종교와 과학 간에 다시 전투를 개시하게 만들었다.
인류의 식량난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기 시작한 ‘체세포조작’의 기술이
포유동물의 ‘무수정’(無受精) 생명복제에까지 이르게 되자, 온 세계는 눈앞에 닥친 ‘인간생명’의 조작에 따른 심각한 윤리 문제와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하게 되었고,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윤리학계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원론적 교리에
치중하여 ‘생명복제’ 기술을 악마화해서 배척만 한다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대한
전향적인 재해석은 불가능한가? ‘복제기술’을 ‘창조세계’의 회복과 보존, 인류의 복지를 위해 선하게 이용되도록 검토할 필요는
없는가?
인간생명의 복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뜨거운 논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멀지 않아 ‘복제인간’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가? 그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배제되는 상품화된 이류 인간으로서 ‘자연인간’의
종속물인가?
우리가 자연적인 출산 방식이나 ‘인공수정’ 방식으로 태어나는 동일한 유전자를 소유한 “일란성 쌍둥이”는 수용하면서도,
‘체세포핵치환’이라는 복제기술을 통해 태어난 동일한 유전자를 소유한 인간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최초의 ‘시험관아기’ 루이스 브라운(Louis Brown)이 ‘인공수정’ 방식으로 태어났을 때, 기독교와 윤리학계는 모두 경악과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인공수정’ 방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불임부부를 위한 자녀출산 방법으로 공인되었으며 윤리적,
신학적으로도 대부분 받아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체세포복제’라는 다른 생식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복제인간’을 배척해야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창조질서를 깨뜨린 ‘사탄의 자식’으로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 하실까?
여기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간(배아)복제’ 기술을 거부함으로써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절규를 외면만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인류의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인간복제’ 기술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로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기독교는 이러한 심각한 질문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신학적, 윤리적 상황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 되었다. (1) 먼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2) 생명 공학의 발달
과정과 오늘날의 생명복제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3) ‘생명복제’ 특히 ‘인간복제’의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점들을 고찰한 후, (4)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한 깊은 성찰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제1장 ‘서론’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2장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서는, 먼저 고대 근동지역의 ‘신화적인 우주론’을 살펴 본 후, 희랍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우주론’을 일원론과
다원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희랍인들은, 힘이 제한되어 있는 그들의 신들은 무(無)에서 우주를 만들어 내지 않았고 우주는 예전부터 언제나 있어
왔다고 믿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플라톤의 “형상들”)이란 초월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사물들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4원소로 이루어졌다는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을
받아들여 ‘4원인설’로 발전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유력한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그 역시 고대 희랍의 다른
우주론자들 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현실을 이해하는데 신의 계시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다음은 성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신학적 우주론’을 살펴보았다. 성서는 우주 자체가 아닌 우주와 떨어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주관을 제시한다.
역사가 자연의 끝없는 순환처럼 반복된다고 믿은 고대 다신론자들에 비해 히브리인들은 역사가 선(線)처럼 진행한다고 생각하였다. 창조 때부터 시작된
시간과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행하며 끝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제2장 제1절 4의 ‘과학적 우주론’에서는 중세의 우주론과 뉴턴의
우주론, 20세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