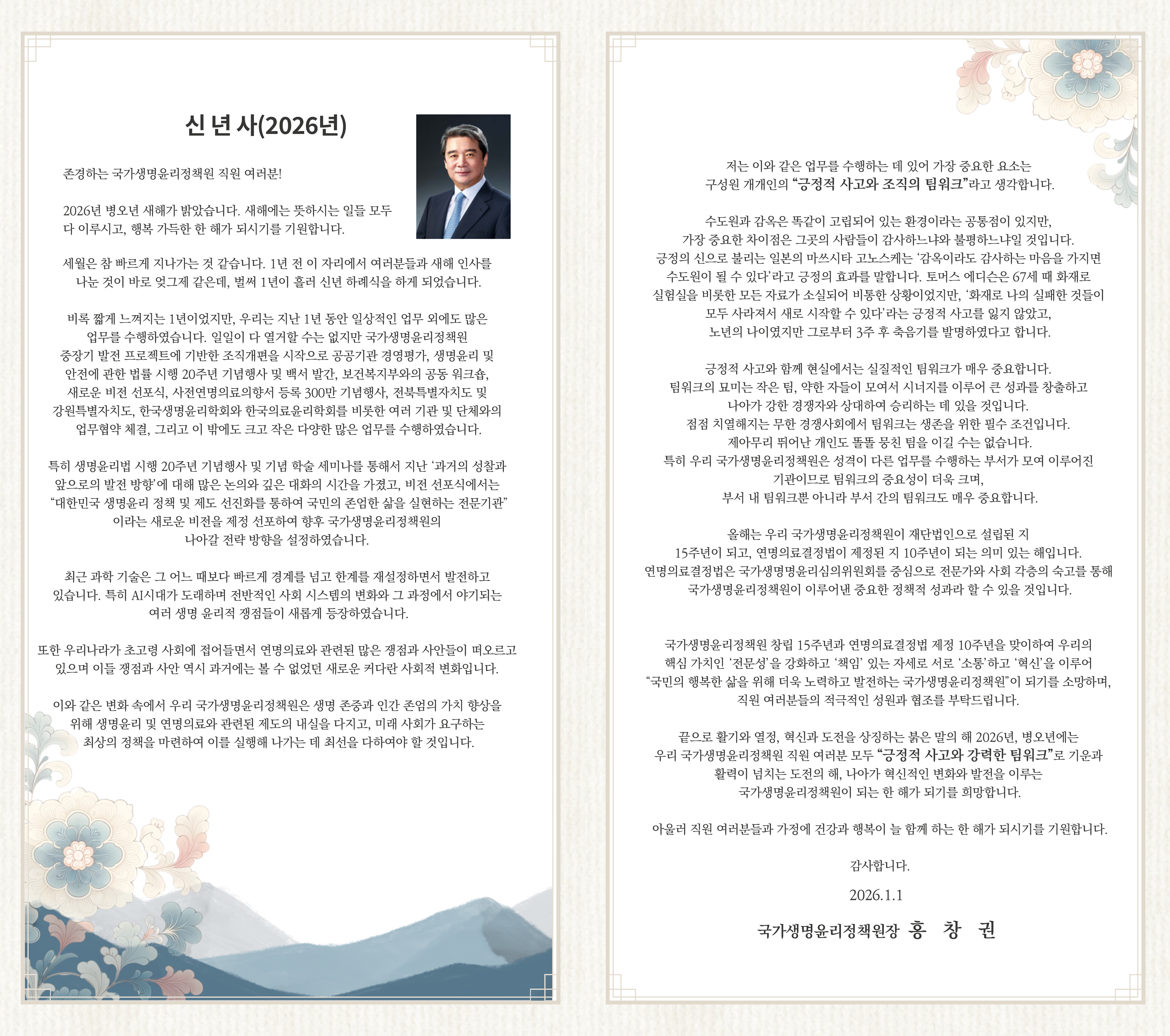한국인 간 기증 세계 1위 기증자 보호는 '부실'
2010년 전세계 26% 차지…미성년 기증 年 수십명
건강관리기간 대부분 1년이하…기증자 46% "경제손실 발생"
한국은 전세계 생체 간 이식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생존자 장기기증이 빈번하면서도 기증자 보호장치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작성한 '장기 등 기증자 차별·불이익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간 기증자는 824명으로 전세계 3천116건(명) 중 26%를 차지해 어느 나라보다 많았다.
생존(생체) 장기이식은 뇌사자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 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0년 국내 간이식 1천67건 중 생체 이식의 비중은 무려 77%로 같은 해 전세계 생체 간이식 비중(15%)의 5배가 넘었다.
신장이식 역시 생체 이식이 62%로 전세계 평균 44%보다 높았다.
지난해 국내 간이식과 신장이식 중 생체 장기의 비중은 각각 74%와 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생체 장기이식 비중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저조한 가운데 혈연간 기증이 많기 때문이다. 이식수술을 권장하는 의료계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생체 이식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기증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별다른 제약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간 기증자 중 11~17세 미성년이 30명이나 됐다.
장기이식 선진국인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극히 예외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 미국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 동의에 앞서 본인의 자발적 선택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정신·심리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증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평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기증 사후 관리도 부실해 기증자의 건강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진이 병원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또는 신장 기증자의 검진 기간은 1년 이하가 각각 83%와 56%를 차지했다.
바람직한 관찰 기간인 '2년 이상'을 관리해준다는 대답은 20%에 못 미쳤다.
기증자들 역시 기증 전후 정보 제공과 지원이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기증자 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29명)는 사전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꼈으며 46%(44명)는 기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대답했다.
특히 기증 후 차별과 불이익을 묻는 질문에 33명은 보험 가입 또는 혜택 제한을 언급, 기증자 차별을 금지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술 부작용 등 여러 위험을 초래하는 생존 기증보다 뇌사자 기증 활성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생존 기증땐 기증자 보호를 위해 기증 전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장기기증을 활성화 한다면서도 기증자 보호장치는 세계적 기준에 많이 모자란다"며 ▲기증자 선별 절차 보완 ▲기증자 건강관리 등 지원 강화 ▲기증자 장기 관찰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