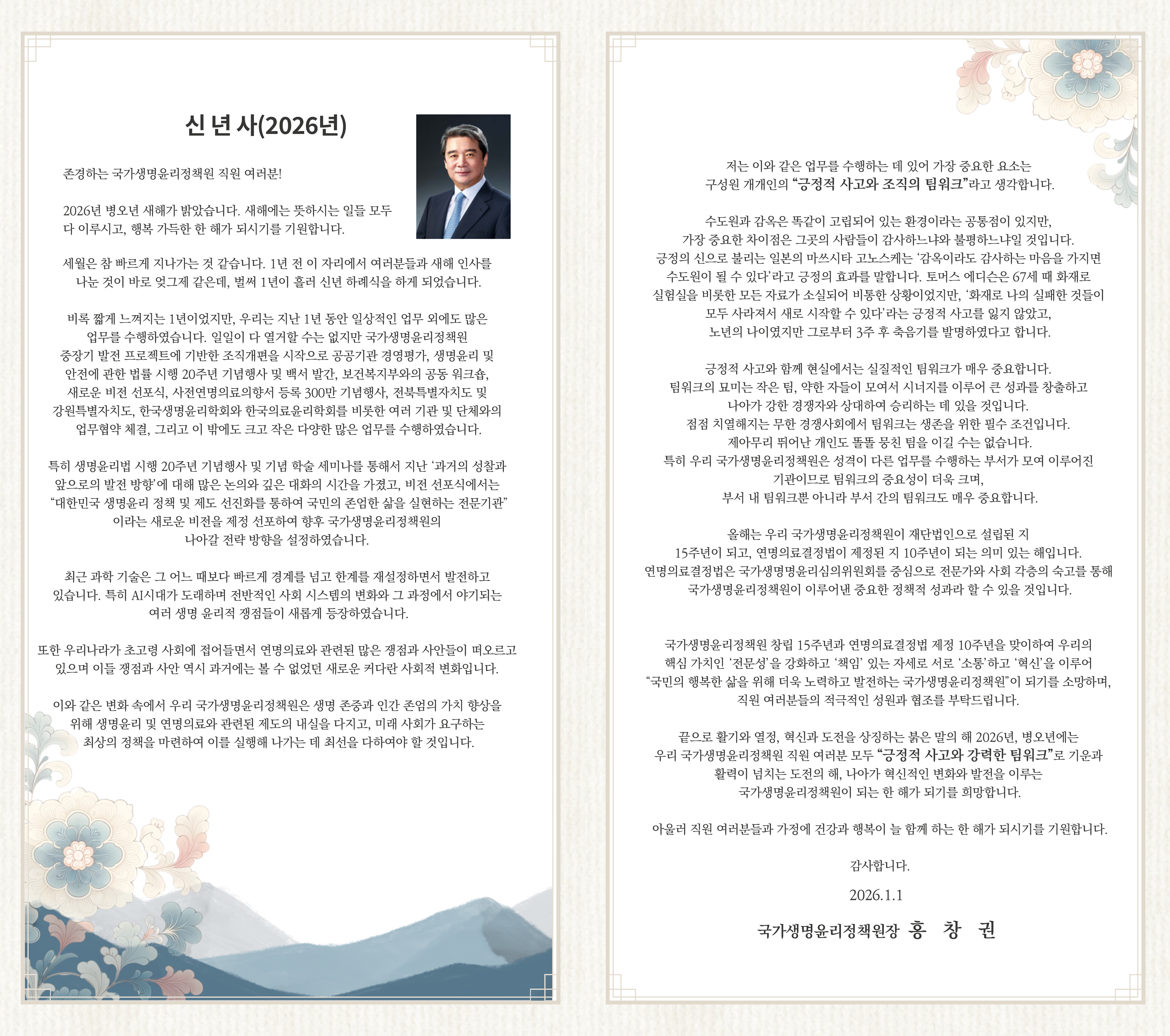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멸종 기술과 시민사회의 책임
□ [기사 1] Gene editing, extinction and ethics: Why open conversation is key
□ [기사 2] The Existential Possibilities for Genome Modification of Species
https://www.thehastingscenter.org/the-existential-possibilities-for-genome-modification-of-species/
□ [참고자료] Deliberate extinction by genome modification: An ethical challenge
□ [참고기사] Trump wants to use the ‘God Squad’ to increase logging, but it must follow strict rules
□ [참고 사이트] Colossal Biosciences 홈페이지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종을 인위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윤리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의도적 종의 멸종: 윤리적 도전
「유전자 편집을 통한 의도적 종의 멸종(Deliberate Extinction by Genome Modification: An Ethical Challenge)」이라는 제목의 연구는 윤리학자, 보존 생물학자, 생태학자,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생명체의 멸종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다.
공동 저자인 애리조나 주립대 생명과학대학의 제임스 콜린스(James Collins) 교수는, 멸종이라는 선택은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지만, 매우 드물고 설득력 있는 사례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팀은 그러한 사례로 다음 세 가지 종의 멸종 가능성 검토를 제시한다 (세부사항은 아래 논문 참조).
이 연구는 ‘누가 멸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라는 거버넌스 문제를 중요한 윤리적 쟁점으로 제시하며, 특히 영향받는 지역사회와 원주민 집단의 실질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자들은 명확한 규칙 대신 “대체 수단이 없고, 이익이 분명하며, 위험이 명확히 이해되는 경우에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지향적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멸종위기종법(ESA, Endangered Species Act)의 일부 조항을 완화해 서식지 파괴를 ‘해로운 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갓 스쿼드(God Squad)’라 불리는 멸종위기종위원회(Endangered Species Committee)의 재소집 움직임이 있었다. 이 위원회는 1978년 설립되어 연방 정부 프로젝트가 멸종위기종에 위협이 될 경우, 경제적·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멸종위기종 보호를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프로젝트를 허용할 수 있다. 참고로 ‘갓 스쿼드’는 47년간 단 두 차례만 보호 면제를 승인했는데, 첫 번째는 흰두루미 서식지에 댐을 건설한 사례이며, 이후 생태계 복원에 성공했다. 두 번째는 북부 점박이 올빼미 서식지에서 벌목을 허용한 사례였으나, 환경단체 소송과 클린턴 행정부 철회로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재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술적·윤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시스(Colossal Biosciences)*는 ‘탈멸종(de-extinction)’ 기술을 통해 아시아코끼리의 유전자를 활용해 털북숭이 매머드의 유사한 형질을 가진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개발중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매머드 복원이 아니며,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 자가 번식의 어려움, 생태계 적응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진정한 복원이라 보기 어렵다.
* 콜로설(Colossal Biosciences)은 2021년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멸종된 동물을 유전공학 기술로 복원하는 ‘탈멸종(de-extinction)’ 프로젝트를 세계 최고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약 4,000년 전 멸종한 털북숭이 매머드의 복원이며, 그 외에도 도도새, 주머니 늑대 등 멸종 동물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으로 특정 종의 의도적 멸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세계 나사충의 경우, 멸종 지지는 가축에게 유발되는 심각한 고통이라는 윤리적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었다. 반면 말라리아 매개체인 아노펠레스 감비아 모기의 경우, 해당 모기를 제거하는 대신 말라리아 원충을 표적으로 삼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므로, 멸종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유전자 편집 기술의 실용적 활용
유전자 편집 기술은 멸종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멸종 위기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반면, 변형된 생물체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유전적 특성이 생태계 내 다른 종에게 퍼지거나 살충제나 기후 변화 저항성을 위한 유전자 편집이 오히려 더 많은 살충제 사용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것이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서식지 보존’의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기술적 해법은 근본적인 생태계 보전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일 뿐이다. 또한 갓 스쿼드와 같은 정책 도구는 매우 신중하게, 생명 존중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논문] Deliberate extinction by genome modification: An ethical challenge 유전자 편집을 통한 의도적 종의 멸종: 윤리적 도전 □ 연구 배경 현대 유전자 편집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개체수를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완전히 멸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 보존과 종의 가치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단순한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의 존재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 목적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종의 보존을 고려할 때, 유전자 편집을 통해 특정 종을 의도적으로 멸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및 검토한다. □ 사례 분석을 통한 종의 멸종 가능성 검토
□ 윤리적 고려 사항
□ 결론 의도적 멸종은 ‘극히 드물고, 대안이 없으며, 이익이 매우 크고, 위험이 명확히 통제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사회 전체의 신중한 숙의적, 민주적 과정이 필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