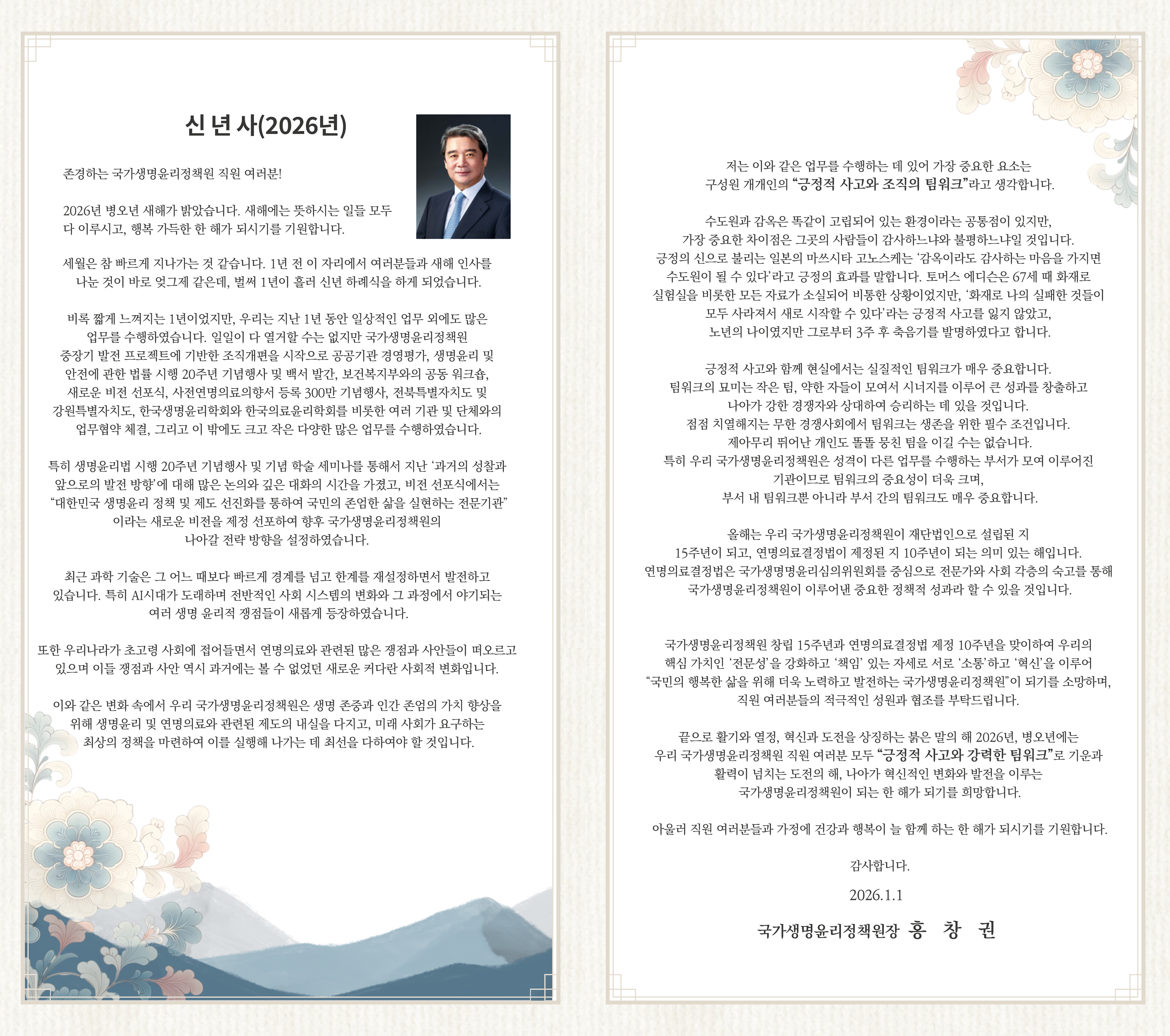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 [기사] Whole Genome Newborn Sequencing Should Not Be a Free-for-all
https://www.thehastingscenter.org/whole-genome-newborn-sequencing-should-not-be-a-free-for-all/#feature-content
□ [참고 기사] The Ethical Minefield of Testing Infants for Incurable Diseases
https://www.nytimes.com/2025/06/05/health/babies-incurable-diseases.html
□ [참고 자료] Sequencing Newborns: A Call for Nuanced Use of Genomic Technologie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874
과거 신생아 검사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나 발병 가능성이 불확실한 질병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만 명의 부모들이 출생 직후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채혈한 혈액을 이용해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는 미래에 매우 심각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이 오늘날 부모와 자녀에게 실제로 유익한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검사 결과의 한계와 불확실성
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WGS)은 질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우선, 검사에서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진단이 아닌 단지 발병 위험도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위험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 위험도가 높고 예측이 신뢰할만 하더라도, 많은 유전 질환에 대해 현재 치료법이 없고, 미래에는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는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부모나 아이가 알게되는 것은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로울 수 있다.
부모의 자율성 논리와 한계
일부 전문가들은 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WGS) 참여 여부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유전학자 로버트 C. 그린(Robert C. Green)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부모가 검사를 받을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아이에게 미칠 해로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많은 부모들은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자녀들의 중증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일을 해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생아 유전자 검사를 참여하는 결정이 부모로서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연구의 목적과 참여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
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WGS)이 실제로 아이에게 유익한지 여부는 신생아 유전자 검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의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전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보다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미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부모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부모가 자녀를 연구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찬성론자들의 논리: 위험을 아는 것이 항상 좋은가?
일부 사람들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만약 아이에게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 정보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그 정보의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로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리: 아이의 유전자 정보, 누구의 것인가?
다른 일부 사람들은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같이 성인기에만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정보는 아이의 미래 자율성 프라이버시(모를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단지 성인 발병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증상이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질병의 경우에도,아이의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되면 미래 성인의 '모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일부에서는 자폐증 관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기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사회적 연결망이 좋은 부모에게만 집중되어 실제 자폐 아동들 간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조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신생아 전장 유전체 분석이 자폐증 위험 아이를 아이들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폐증은 일반적으로 2세 이후에 발달하며 때로는 훨씬 늦게 나타난다. 만약 신생아 시기에 자폐증 위험을 식별할 수 있고, 조기 개입으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이 검사는 모든 신생아에게 권장되어야 하고, 조기 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신생아 유전체 분석(newborn genome sequencing)은 윤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현재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국가적 판단 없이, 개인이나 연구진이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신생아 선별검사(newborn screening)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와 기준 아래 다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위원회나 연방 윤리위원회가 신생아 유전자 검사로부터 나온 과학적 증거를 평가하고, 언제,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이 검사를 사용할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이런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임의적 결정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공의 대응이 보다 바람직하다.
|
[참고자료] Sequencing Newborns: A Call for Nuanced Use of Genomic Technologies (초록)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유전체 분석(genome sequencing)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와 공중보건이 개선되어 아이들, 가족,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신생아가 출생 시 유전체 분석을 받아 평생에 걸친 맞춤형 의료와 예방조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개인 건강에 대한 시퀀싱 데이터 해석의 어려움, 경제적 비용, 그리고 불확실한 검사 결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 유전체 분석은 증상이 있는 신생아의 진단과 치료에는 유용하지만, 건강해 보이는 신생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 도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질병에 대한 표적 분석은 유익하지만, 전체 게놈 시퀀싱을 신생아 선별검사의 유일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따라서 신생아 분석 기술은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